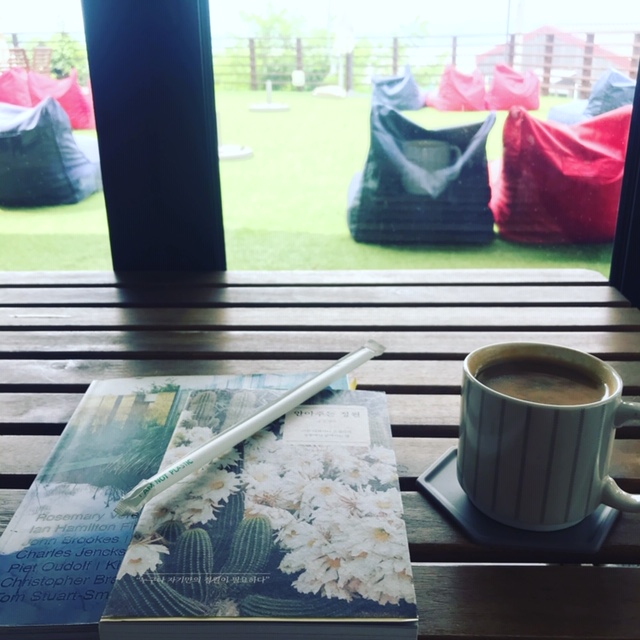
안아주는 정원
방송작가에서 정원작가로 변신한 오경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가드너 중 한 명이다. 정원관련으로 여러 책도 집필하면서 ‘도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이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정원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서술한다. 정원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로와 치유다. 식물의 태도로부터 배운 삶의 가치관이 글의 곳곳에 배어있다.
“온갖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 쉬고 싶을 때 나는 집이 아니라 정원에 간다.
그곳에 가면 자연의 너른 품 안에서 보호받는 듯 편안한 느낌이 들고,
온갖 풀과 꽃이 친구가 되어준다” – 영국작가, 엘리자베스(1898년)
정원은 오래도록 인간의 쉼터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정원이나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효과가 있다는 ‘초록효과’가 입증됐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정원은 분명히 인간에게 유익한 곳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정원’이란 대상의 중심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중국 격언에 씨앗을 심을 때는 네 알을 심는다고 한다. 하나는 새에게, 하나는 죽을지도 모를 식물로 마음이 아플 정원주에게, 그리고 나머지 두 알은 거둔다고 한다. 다양한 변수로 식물이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위로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네 개의 알이 자라나 모두 꽃이 핀다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여기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말한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속담은 흔히 인간의 노력을 가리킨다. 노력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식물에 빗대어 표현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씨를 뿌렸을 때 식물이 알아서 자라나 준다는 전제가 녹아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식물은 잘 죽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죽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다. 정원을 관리해보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식물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식물의 모습은 인간과도 닮아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히 위로를 받게 된다. 식물이 주는 의학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같은 생명체로서의 동질감이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원은 ‘보는 것’ 또는 ‘가는 곳’이 아니라, ‘가드닝’이라는 노동과 참여의 표현으로 쓰이는 듯하다. ‘정원일’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원이라는 대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
작가는 식물의 주기를 부각한다.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나 민감한 것이 계절과 절기다. 식물은 매년 성장과 쇠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식물을 식재할 시기, 열매를 수확할 시기, 적과를 할 시기, 가지를 유인하여 지주대에 잡아주는 시기, 꽃대를 잘라주는 시기, 월동을 해야할 시기와 이를 해체하는 시기 등 365일은 연속적인 작업의 일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일들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달력의 숫자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때가 왔다는 것은 식물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이다. 정원관리자의 애정과 관심으로 그 시기를 아는 것이다. 식물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다.
식물은 듣는 기능이 없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식물은 이것이 없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생존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내재돼 있다고 해석한다.
그 힘은 무엇일까. 나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아름다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쁘고 귀여운 모습과 함께, 아프고 병든 모습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는 새가 날아들고, 나비와 벌들이 다가온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도 다가온다.
내재된 가장 강한 힘은 바로 ‘공존과 공생’의 능력이다. 정원의 가장 중심에는 함께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어울리는 생명체들은 위로를 받고 서로가 치유를 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다.
– 안아주는 정원 / 오경아, 2019.
*책을 선물해주신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파주의 한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